글
민음북클럽 손끝으로 문장읽기 9회 :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 (3주차)
정용준, 『내가 말하고 있잖아』, 민음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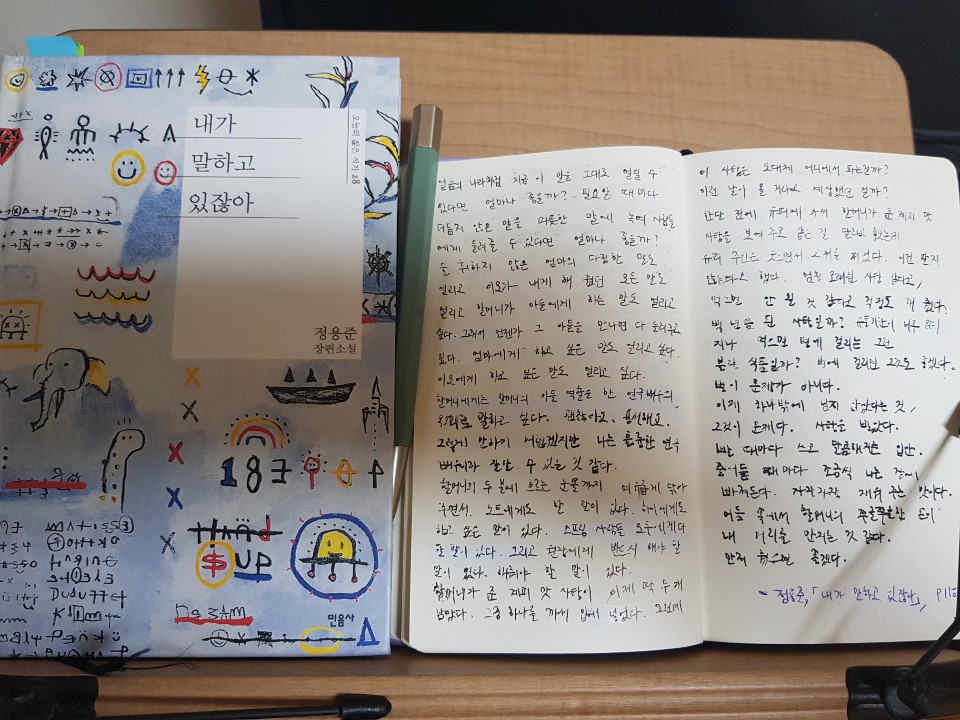
어느덧 정용준 작가님의 『내가 말하고 있잖아』를 읽은지 3주가 지났고, 작품을 완독했다. 사실 책의 지면이 그리 길지 않아 충분히 하루에 완독할 수 있는 길이였지만, 민음북클럽 '손끝으로 문장읽기' 프로그램을 위해 3주간에 걸쳐 조금씩 끊어 읽으며 더욱 오래 소년과 함께하면서 아이를 바라보고 깊이있게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 있어 유의미했다.
발표를 '망쳤다'고 생각한 소년이 '스프링 언어교정원'에 나가지 않게 되자 교정원의 사람들은 소년의 부재(不才)로 인해 그를 그리워한다. 그만큼 언어교정원에서 소년이 스스로를 그저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라고 여겼던 것과 달리 교정원의 사람들은 이미 소년을 공동체 안의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으며, 특히 소년의 발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까지 표현한다.
소년도 스프링(언어교정원)에 나가지 않는 사이, 그에게 영향을 준 스프링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 할머니, 이모, 노트, 하이, 원장에 이르기까지-을 그리워하며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한다.
얼음의 나라처럼 지금 이 말을 그대로 얼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필요할 때마다 더듬지 않은 말을 따뜻한 말에 녹여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술 취하지 않은 엄마의 다정한 말도 얼리고 이모가 내게 해 줬던 모든 말도 얼리고 할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도 얼리고 싶다. 그래서 언젠가 그 아들을 만나면 다 들려주고 싶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도 얼리고 싶다. 이모에게 하고 싶은 말도 얼리고 싶다. 할머니에게는 할머니의 아들 역할을 한 연극배우의 목소리로 말하고 싶다. 괜찮아요. 용서해요. 그렇게 말하기 어렵겠지만 나는 훌륭한 연극배우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할머니의 두 볼에 흐르는 눈물까지 여유롭게 닦아 주면서. 노트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이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스프링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원장에게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 해 줘야 할 말이 있다. 할머니가 준 계피 맛 사탕이 이제 딱 두 개 남았다. 그중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다. 그런데 이 사탕은 도대체 어디에서 파는 걸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예상했던 걸까? 한 달 전에 슈퍼에 가서 할머니가 준 계피 맛 사탕을 보여 주고 같은 걸 달라고 했는데 슈퍼 주인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이건 팔지 않는다고 했다. 엄청 오래된 사탕 같다고. 먹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걱정도 해 줬다. 백 년쯤 된 사탕일까? 유통기한이 하루 지나 먹으면 병에 걸리는 그런 불량 식품일까? 병에 걸리면 그것도 좋겠다. 병이 문제가 아니다.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문제다. 사탕을 빨았다. 빨 때마다 쓰고 달콤해지는 입안. 줄어들 때마다 조금씩 나는 잠에 빠져든다. 자장자장 재워 주는 맛이다.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쭈글쭈글한 손이 내 머리를 만지는 것 같다. 만져 줬으면 좋겠다.
- 정용준, 『내가 말하고 있잖아』, 민음사, 2020, 118-119쪽.
이 지점에서 '관계 속의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혈연으로 엮여진 가족보다도 오히려 깊이있게 내면이 맞닿은, 내면과 감정의 선을 이해하는 타인들과의 관계가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이 작품을 통해 다시금 느꼈다. 특히 경찰서에서 진술하는 소년을 보호해주기 위해 스프링의 모든 이들이 합심해 나설 때 그 사랑과 애정의 힘이 더욱 크게 느껴졌다.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노트에 쓰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 관찰한 것. 느낀 점.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괴로운 것들 모두 쓰게 합니다. 때론 시나 소설처럼 문학적인 상상력 같은 것들까지 쓰게 하죠. 그러니까 그건 일기장이 아니라 마음을 언어로 옮기는 연습장 같은 거예요. 언어를 풍성하게 하고 말을 잘하기 위함이죠. 교정원 사람들은 다 그런 노트를 쓰고 있어요.
- 정용준, 『내가 말하고 있잖아』, 민음사, 2020, 138쪽.
용서와 복수. 작품의 초반부터 조금씩 생각나게 하지만 마지막에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이 화두는 과연 양립이 가능한 것일까. 누군가를 용서하고싶으면서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하는(애증)의 마음. 심리학에서는 이를 양가감정이라고 한다. 어쩌면 우리가 이러한 양가감정을 조금 더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작품속 소년처럼 '신뢰로운', '신뢰할 수 있는' , '좋은' 이들을 만나고, 마음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나만의 수단(매개체)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소년과 같이 '글쓰기'가 될 수도, 반 고흐의 '그림이' 될 수도, 프레디 머큐리의 '음악'이 될 수도, 그리고 헤르만 헤세처럼 글쓰기와 그림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긴다.
한 생애를 살면서 결코 단순할 수 없는 우리네 마음 자리를, 복잡한 내면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매개물과 더불어 이를 알아 줄 사람들이 주변에 자리한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들이 자리한다면 - 그것이 바로 내면의 외상을 극복하고 한 차원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다음 주차에 작가의 말과 더불어 생각을 좀 더 정제하여 작품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내면화하고 싶다.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미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할 수 있고 싫지만 좋을 수도 있으니까. 복수하고 싶으면서 용서하고 싶은 것도 가능하지. 그런데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진다.
- 정용준, 『내가 말하고 있잖아』, 민음사, 2020, 150-1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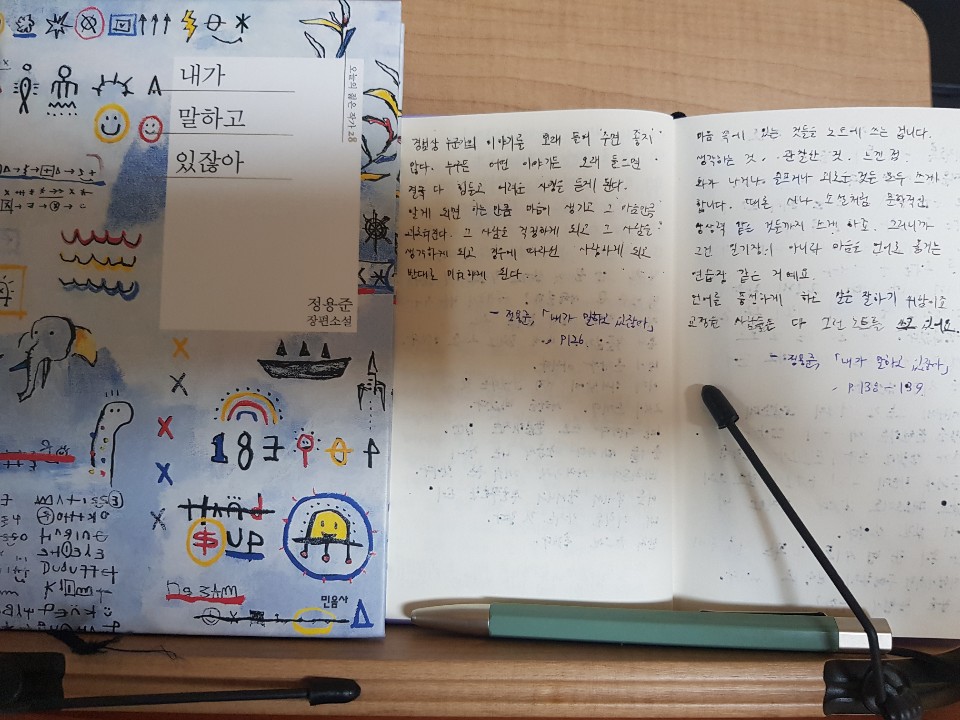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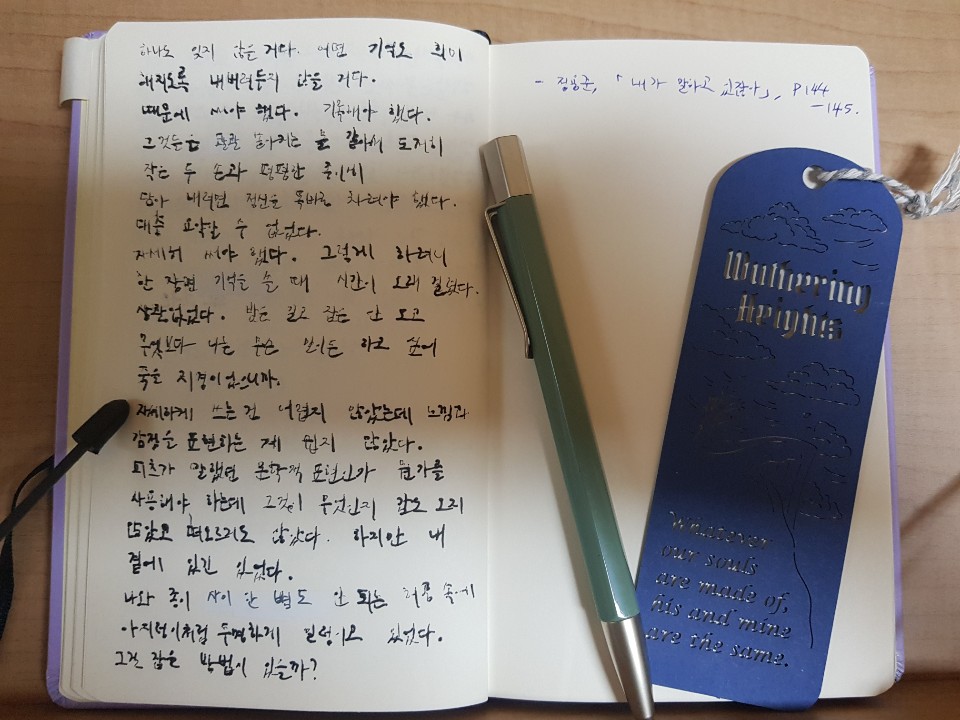
'Readin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르나르 베르베르, 『심판』, 열린책들, 2020. (0) | 2020.09.26 |
|---|---|
| 민음북클럽 손끝으로 문장읽기 9회 (4주차 최종감상평) - 정용준, 『내가 말하고 있잖아』 (2) | 2020.08.19 |
| 민음북클럽 손끝으로 문장읽기 9회 (2주차) - 정용준, 『내가 말하고 있잖아』 (0) | 2020.08.05 |
| [독립북클러버 9기- 청춘의책탑] 9회차(9기 3회차)-「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후기 (0) | 2020.07.31 |
| 민음북클럽 손끝으로 문장읽기 9회 (1주차) - 정용준, 『내가 말하고 있잖아』 (0) | 2020.07.29 |

